
하동관은 《식객》에 등장하는 맛집 중 역사가 가장 깊다. 1939년에 문을 열어 70년 전통을 이어오는 동안 세 세대에 걸쳐 손바뀜을 했다. 서울 북촌 반가의 딸로 태어난 창업주 류창희 씨가 친구의 며느리에게, 그 며느리가 늙어 다시 그의 며느리 김희영 씨에게 물려주어 오늘에 이른다.
대를 이어온 정직한 맛이 우리집 비결 – 김희영 ‘하동관’ 대표
1968년에 물려받아 41년째 국솥을 지키는 동안 그 며느리도 늙어 할머니가 됐다. 김희영 할머니도 이제 딸에게 국솥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곳을 다녀간 명사는 수두룩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특히 즐겨 찾았고, 육영수 여사도 종종 왔다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회창 전 총리 등 단골은 일일이 셀 수 없다. 하동관에 들어서니 딸 장승희 씨가 카운터를 지키고, 김희영 할머니는 카운터 뒤의 한 평 남짓한 골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한자리를 지켜 오던 하동관은 지난해 6월 명동으로 이사했다. 청계천 일대 재개발 때문에 밀려난 것. 김희영 할머니는 “나 인터뷰 같은 거 잘 안 해” 하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난 그에게 인터뷰를 왜 안 하는지를 먼저 물었다. “너무 표면화되는 건 싫어. 정직하게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고, 그 돈으로 우리 식구들이 밥 먹고 살면 그걸로 족해. 돈 벌어서 죽을 때 가져가나? 죽으면 한 평짜리 땅 하나가 전부인데….”
 하동관은 한결같은 맛을 지키기 위해 분점이나 체인점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름만 쓰게 해 달라며 거액의 돈으로 유혹하는 손길이 많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강남에 있는 동명의 곰탕집은 엄밀히 말해 같은 집이 아니다. 김희영 할머니의 시동생이 운영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호를 쓰게 했다 한다.
하동관은 한결같은 맛을 지키기 위해 분점이나 체인점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름만 쓰게 해 달라며 거액의 돈으로 유혹하는 손길이 많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강남에 있는 동명의 곰탕집은 엄밀히 말해 같은 집이 아니다. 김희영 할머니의 시동생이 운영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호를 쓰게 했다 한다.
하동관은 저녁 장사를 하지 않는다. 오후 4시~4시 30분에 문을 닫는다. 전날 저녁 끓여 놓은 곰탕이 다 팔리면 문을 닫는다. 불야성 명동에서 일찍 문을 닫다 보니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 밤에 몰래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람이 많다고. 감시하느라 CCTV를 설치했는데, 요즘 김희영 할머니는 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재미에 빠졌다고 한다.
하동관을 이어받을 장승희 씨는 곰탕집 안주인 이미지로는 의외다. 성신여대 음대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한 그는 패션모델을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늘씬하고, 앞치마 대신 정장을 갖춰 입는다. 경제신문사 광고부에서 6년간 근무했던 그는 하동관을 물려받기 위해 지난해 직장을 그만뒀다.
“사회에 나와 보니 하동관이라는 브랜드가 다르게 보였어요. 우리나라 외식업계에 있어서 하동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브랜드를 지키는 게 제 꿈을 펼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연세도 있으시니까 더 늦기 전에 노하우를 전수받아야죠.”

장승희 씨에게 노하우를 다 전수받았냐고 묻자,”이게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필요한 것 같아요”한다. 하동관 곰탕은 규격화, 표준화된 맛을 거부한다. 인공 조미료가 없던 시절, 몇 가지 안 되는 재료로 맛을 내던 ‘그때 그 국물 맛’을 지켜 왔다. 하동관 곰탕을 끓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쇠고기 양지와 사골, 내장만 넣고 푹푹 삶으면서 수시로 기름기를 걷어 내는 게 전부다. 다른 재료는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 김희영 대표는 “우린 생강, 마늘 이런 잡탱이도 안 넣어”한다.
고기 자체에서 나는 약간의 누린내와 내장에서 우러난 단내 나는 국물이 바로 하동관표 곰탕의 특징이다. 순결한 쇠고기 국물 맛이라고 할까. 간혹 나이 지긋한 손님 중에는 곰탕 국물에 날달걀을 풀어 넣어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고기가 귀하던 시절 단백질을 보다 많이 섭취하기 위해 먹던 방식이라고 한다.
쇠고기 양지와 사골, 내장만 넣고 푹푹 삶지
재료 넣고 푹푹 삶는다고 다 하동관 곰탕이 되는 건 아닐 터, 다른 집에서는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하동관만의 비결은 뭘까? 김희영 사장은 ‘엄선된 재료’에서 그 답을 찾는다.
“다른 재료는 다 필요 없어. 좋은 고기만 쓰면 돼. 우린 60년 넘게 한 집에서 키운 한우 암소 고기만 써 왔어. 배추는 강원도에서, 무는 제주도 것만 써. 여기 이 소금은 국산 꽃소금이지. 이 깍두기? 서울식인데, 여기에도 별다른 재료가 안 들어가. 새우젓, 고춧가루, 소금, 설탕 약간만 넣어. 깍두기는 매일 담가서 3~4일 익힌 후 냉장고에 넣었다가 상에 내.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변하지 않는 맛을 찾아서 오는 거거든. 깍두기도 만날 똑같은 맛을 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미혼의 외동딸이 곰탕집을 이어받겠다고 나섰을 때, 김희영 씨는 착잡했다. 고마운 한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평생 살아온 길을 딸이 고스란히 걷도록 허락하는 건 쉽지 않았다. 집안 대소사는 물론, 딸의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하동관을 지켜 온 고집스런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는 남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인터뷰가 어색하다며 잠깐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딸이 털어놓은 선행이 수두룩하다. 얼마 전에는 한 대학병원에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한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난 대가를 바라지 않아. 주고는 잊어버려. 돈은 벌어서 다 나눠 줘 버렸어. 재산은 이거랑 여의도 집 한 채가 전부야. 평생 여기 이렇게 살다 보니 가끔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거든. 그럴 때마다 좋은 일에 썼어.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난 대가를 바라지 않아. 주고는 잊어버려. 돈은 벌어서 다 나눠 줘 버렸어. 재산은 이거랑 여의도 집 한 채가 전부야. 평생 여기 이렇게 살다 보니 가끔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거든. 그럴 때마다 좋은 일에 썼어.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그는 여전히 순화동 시절을 그리워한다. 고층빌딩이 즐비한 명동 한복판에 푹 파묻혀 있는 이곳에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출근길에 순화동에 있는 옛 하동관 터에 들른다고. 작년엔 매일 한 번씩 들렀다고 한다.
“내 인생을 바친 곳이잖아. 거기는 한옥 두 채가 이어져 쉴 곳이 많았어. 여기는 쉴 곳이 없어. 정을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 이제는 얘가 여기에 정을 붙여야지.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의 인생 얘기에 감정이입 된 승희 씨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국솥을 맡은 41년간 변함없이 ‘하동관 곰탕 맛’을 지켜 낸 김희영 사장. 4대째 주인이 될 장승희 씨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손님들이 대대로 오시잖아요.’딸도 역시’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잘할 마음도 없고, 더 잘할 수도 없어요.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연구한다는 자체가 하동관에서는 무의미해요. 오랜 세월을 내려온 이 맛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 유일한 역할이자 숙제예요.”
출처 : TOP CLASS, 2008.09 / 만화 식객이 찾은 맛집
글 : 김민희 기자, 사진: 장성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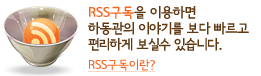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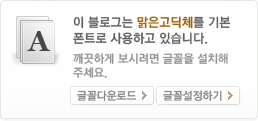
 brandpage™
brandpage™